50명 채용 공고가 보여준 것: 현대차 자율주행의 ‘전략 전환’ 체크리스트
2026-02-03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92300?sid=103

현대차 자율주행의 ‘전략 전환’ 체크리스트
50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공고가 요구하는 능력의 조합이다. 이번 건은 “사람 뽑는 공고”가 아니라,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어떤 운영체제로 굴릴지를 드러낸 문서에 가깝다.

50명은 ‘개발 인력’이 아니라 ‘조직 구조’다
대기업에서 진짜 어려운 건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 경로다. 6,500명으로도 실패한 사례(CARIAD)가 말해주는 건, 사람을 늘리면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관료가 늘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50명은 “적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작게 유지해 결정 비용을 낮추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성패는 역량이 아니라 분리된 권한(독립성)에 달린다.
E2E 전환은 “코드 삭제”가 아니라 “책임의 이동”이다
E2E는 30만 줄 코드를 버리는 이벤트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는 책임이 규칙(사람)에서 데이터·모델(시스템)로 옮겨간다는 것.
이 전환의 부작용은 명확하다.
테스트/검증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 가능한 체계가 필요해진다
안전/법규 대응은 기존 방식보다 더 무거워진다
즉, E2E는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규제·품질·책임 체계까지 포함한 운영 모델 전환이다.
현대차의 진짜 상대는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방식”이다
테슬라를 이기려면 테슬라처럼 해야 한다는 말은 쉬운데, 진짜는 그 다음이다. 테슬라의 강점은 모델이 아니라:
차량에서 데이터 수집
라벨링/자동 라벨링
학습/배포
다시 차량에서 회수
이 “폐루프 파이프라인”이 일주일 단위로 도는 운영 능력이다.
현대차가 하드웨어 양산에 강해도, 이 루프가 월 단위로만 돌면 경쟁이 아니라 시간 격차가 벌어진다. 공고가 E2E/VLA를 강조하는 건, 결국 “모델”이 아니라 루프를 돌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VLA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차량용 에이전트’로 확장되는 징후다
VLA(Vision-Language-Action)는 운전만 잘하는 모델이 아니다.
VLA를 넣는 순간 차량은:
보고(센서)
이해하고(언어/지식)
행동하는(제어)
“행동 가능한 에이전트”가 된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성공하면 자율주행을 넘어 차량 OS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즉, 현대차가 노리는 건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차를 AI 기기로 바꾸는 전환일 수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송창현 전 대표가 남긴 “레거시와의 충돌”은 기술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 권한 충돌을 뜻한다.
E2E/VLA는 기존 조직의 KPI(프로젝트/부서/품질/법규/출시 일정)와 충돌한다.
그래서 이번 50명의 관건은:
남양 연구소 vs 포티투닷 간 KPI를 누가 쥐는가
실패를 누가 감당하는가
“PPT 보고”가 개발 시간보다 우위가 되는 순간이 오는가
기술은 따라갈 수 있다. 조직은 따라가기 어렵다.
50명은 ‘특공대’가 아니라 ‘새 운영체제 설치팀’이다
이 채용 공고가 시끄러운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설계 때문이다.
성공 시나리오는 단순하다.
작은 팀에 권한을 주고
데이터 루프를 주 단위로 돌리고
E2E를 “기능”이 아니라 “운영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것
실패 시나리오도 단순하다.
기존 조직이 흡수/간섭하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무늬만 E2E”가 되는 것
결국 질문은 하나다.
그 50명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느냐.
현대차가 자율주행에서 바꾸려는 건 코드가 아니라, ‘권한’인지도 모른다.
 블로그 글
블로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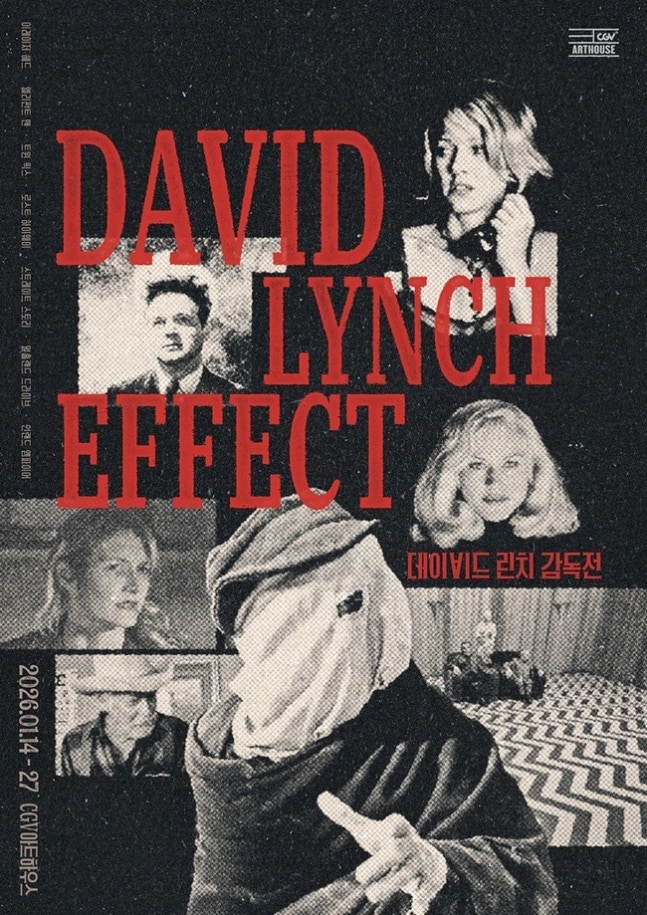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